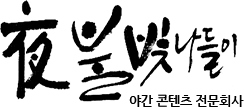불빛나들이
- 전통등의 탄생
-
한국 고유의 등을 의미하는 “전통등(傳統燈)”. 언제부턴가 전통등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사용되며,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전통등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이나 민속사전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다.
“전통등”이란 단어는 20여 년 전 불교계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기존의 등과는 다른 개념의 등”이라는 의미로 붙였다. 당시 불교계에는 주름등과 일본풍의 공등(현재 사용되는 만월등과는 다르다.)이 주류를 이뤘으며, 조금 신경 써서 만드는 등이 연꽃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전통등이란 이름은 한국 고유의 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적절한 작명이었다.
전통등의 탄생은 20세기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불교계도 불교 고유의 문화유산을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전통등은 불교의 정신을 담은 콘텐츠 중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굴되었다. 이런 생각은 적중해서 현재 전통등은 불교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성장했다.
등은 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불이 외부요인에 의해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등덮개와 불 자체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등의 기원을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류가 미(美)를 추구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등의 기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세기 고구려 무덤인 안악3호분에서 그 원형이 최초로 발견된다. 등이 의례에 사용된 것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였으며, 고려시대 연등회와 조선시대 관등놀이를 통해 민속놀이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쇠퇴해서 1990년대에는 그 실물을 접했던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통등의 복원이 어려웠던 것도 실물을 확인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설사 실물을 접했다고 해도 수박등· 마늘등·공등과 같은 단순한 형태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행히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옛 문헌에 전통등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어 대략적인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점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문헌에서 확인된 전통등은 노장스님들과 민속학자들이 고증에 나섰고,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의 젊은 불자들이 제작을 책임졌다.
이때가 1996년으로, 복원주체는 초파일 행사를 진행하던 행사기획단(현 연등회보존위윈회)이었다. 최초의 전통등 전시회는 1997년 초파일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렸는데, 이름만 남아 있던 전통등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전통등 시현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1997년 전시회에는 20여점의 전통등이 전시되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별 것 아니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때 초파일 제등행렬에 사용될 장엄등도 제작되었는데, 크기가 1미터를 겨우 넘는 목어등과 종등이었다. 이전까지 장엄물 일색이던 연등축제에 장엄등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후 전통등은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모두가 사랑하는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야풍속과 등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길흉화복이 함께하는 인간사에서 나쁜 기운을 배척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로 나타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수세(守歲)라고 하여 집안 곳곳에 붉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다.
수세는 단순히 날을 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풍속들로 구성된다. 우선 어둠을 쫓기 위해 불을 밝히는 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화장실과 외양간 등 집안의 모든 장소에서 행해졌다. 특히 민간에서는 부뚜막에 불을 밝히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이는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竈王神)이 섣달그믐 천신(天神)에게 그 집안에서 일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보고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엌이 아닌 다른 장소에 정성을 기울이기도 했다. 대청마루의 성주불, 우물가의 용왕불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 북부지방에는 액맥이라고 하여 섣달그믐 켜놓은 촛불을 훔쳐가는 풍속도 있었다. 이때 촛불을 훔치다 들켜서 욕을 먹으면 길하다고 하여 억지로 들키기도 했는데, 이를 명도적(命盜賊)이라고 했다. 또한 섣달의 긴 밤을 보내기 위한 놀이로 윷놀이, 저포놀이 등도 행해졌다. 섣달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속설도 있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아이를 놀리기 위해 눈썹에 하얀 가루를 묻혀서 놀래키기도 했다.
수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8세기 저술된 세시기에 수세의 풍습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는 풍속으로 정착됐음이 확인된다. 또한 고려시대 길거리에 불을 밝혀서 역질(疫疾)을 쫓는 나례(儺禮)가 섣달그믐 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사는 훨씬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세의 전통을 중국에서 찾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의 ‘소동파가 촉나라 풍속을 기록하면서 술과 음식으로 서로 초청하는 것을 묵은해를 전별한다는 뜻으로 별세(別歲)라 하고 섣달그믐에 날을 세는 것을 수세라 한다.’는 기록이다. 소동파(1037~1101)는 송나라 사람이며 촉나라(221~263)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촉나라다.
함경도 풍속에는 섣달그믐 빙등(氷燈)을 설치해서 밤새도록 밝히기도 한다. 빙등은 아름드리 기둥 같은 초롱 속에 기름 심지를 안전하게 놓고 불을 켜는 등으로, 얼음의 안쪽을 파서 등잔을 만들고 여기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빙등은 나례의 장엄등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례는 징과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행사로 궁중에서도 행해졌다. 넓은 의미에서 현대의 제야행사도 이런 전통에서 비롯됐다 하겠다.
섣달그믐 풍속은 언젠가부터 잊혀진 전통이 됐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안 곳곳 불을 밝히며 한해를 맞는 일도 우습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새해를 맞는 인간의 소망은 같다. 다가오는 섣달그믐에는 떠들썩한 제야행사보다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성스럽게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